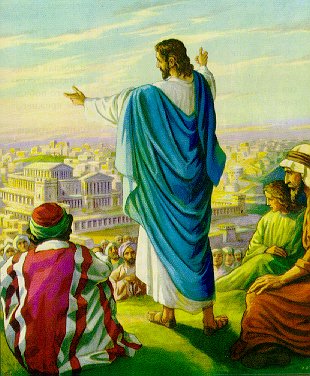
육상산과 왕양명-이론보다 깨달음설파한 心學의 선지식
육상산은 중국 강서성 출신
지난번에 언급한 것과 같이 신유학(新儒學)에는 두 갈래 큰 흐름이 있었다. 그 하나는 정이(程 , 1032~1085)와 주희(朱熹, 1130~1200)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하는 정주학(程朱學) 혹은 이학(理學)이고, 다른 하나는 정호(程顥, 1033~1108)가 시작하고 육상산(陸九淵, 象山, 1139~1193)이 터를 닦고, 왕양명(王守仁, 陽明, 1473~1529)이 완성한 육왕학(陸王學), 양명학(陽明學) 혹은 심학(心學)이었다.
역사적으로 정주학이 대세를 이룬 반면 양명학은 거기에 비해 크게 빛을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사상 체계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가르침은 오늘도 깨우쳐 주는 바가 크기에 육상산, 왕양명 두 스승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음미해 보기로 한다.
육상산은 중국 남송의 사상가로서 지금의 강서성(江西省)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육구연(陸九淵). 여기서는 우리 귀에 더욱 익숙한 육상산이라는 그의 호를 쓰기로 한다. 육상산은 6형제의 막내로 형인 육구소(陸九韶), 육구령(陸九齡)과 함께 당대에 학문으로 이름을 날렸다. 33세에 진사 시험에 합격하여 관리직을 수행하며 학문과 교육에 힘썼다.
육상산의 사상은 어릴 때 가진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가 열세 살 때 하루는 책을 읽고 있다가 책에서 ‘우(宇)’라는 글자와 ‘주(宙)’라는 두 글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 때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우주가 곧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곧 우주다. 동쪽 바다에 성인이 나타난다면 똑 같은 마음(心), 똑 같은 이(理)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고 했다. 내 속에 있는 심(心)은 이(理)와 마찬가지로 분화되지 않은 보편적 원리라는 뜻이기도 하다.
육상산은 9년 연상인 주자와 서신으로 뜨거운 논쟁을 하며 서로를 비판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해 존경의 염을 품고 있었다. 그는 형 육구소와 함께 주돈이의 태극도설(太極圖說)에 나오는 무극(無極)의 문제를 놓고 주자와 의견을 달리했다. 주자는 무극을 무형상(無形象), 무형적(無形迹)의 절대적 초월성으로 이해한 반면, 육상산 형제는 무극이 노자의 말일 뿐 『주역』에는 없는 개념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宇와 宙’자 보고 깨달음 경험
육상산이 37세 되던 해에는 아호사(鵝湖寺)라는 곳에서 주자를 직접 만나 토론을 했는데, 이것이 중국 사상사에서 유명한 ‘아호지회(鵝湖之會)’라는 것이다. 여기서 토의 주제는 수련법이었다. 주자는 격물(格物)·궁리(窮理)가 여러 가지 사물을 하나하나 널리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데 반하여, 육상산은 그 많은 사물을 다 섭렵한다는 것은 ‘지리(支離)’한 일이라 했다. 그는 “마음이 곧 이(心卽理)”라고 하는 기본 원리를 근거로, 마음이 여럿 있는 것이 아니라 심일심(心一心)이며, 이(理)가 여럿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일리(理一理)이므로 결국 내 마음을 밝혀 아는 것이 바로 사물과 우주를 관통하는 원리를 깨닫는 것이라 보았다. 주자가 ‘성즉리(性卽理)’라고 한데 반하여 육상산이 ‘심즉리(心卽理)’라 했다고 하는 것은 비록 글자 한자 차이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학과 심학을 나누는 기본 핵심이었다.
주자는 앞에서 본 것처럼 마음도 다른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이(理)와 기(氣)로 구성된 하나의 구체적 사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理) 자체일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심(心)을 성(性)과 정(情)으로 나누고 성은 하늘에서 준 순수한 선성(善性)이고, 정은 우리가 가진 감정으로서 인욕(人欲)이라 주장하며, 마음 속에 있는 성(性)만이 이(理)라고 하였다. 그러나 육상산은 성과 정을 아우르는 마음이 곧 성(性)이고 그 마음이 곧 이(理)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마음과 성, 마음과 이(理)를 구별하는 것은 오로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기에 앞에서 본 것처럼 그는 주자와 달리 마음을 밝히기만 하면 거기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理)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心은 理와 같은 보편적 진리
육상산은 수행법으로 세 가지를 권한다. 자신을 알라, 배운 것을 실제적인 윤리 생활에 적용하라, 그리고 정좌(靜坐)하라는 것이다. 얼른 보아 순서는 다르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다. 육상산은 49세에 사숙을 열어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후 몇 년 있다가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육상산의 사상은 명(明)대의 진백사(陳白沙, 1428~1500)를 거쳐 왕양명(王陽明)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왕양명은 중국 저장성 출신
본명은 왕수인(王守仁)으로 지금의 저장성(浙江省) 출신이다. 어려서 진사에 급제, 그 이후 학자, 정치가, 군인으로 크게 공헌하였다. 불교, 무예, 시학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빼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왕양명도 처음에는 그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로 군림하던 주자학에 심취했다. 21세 때 모든 사물에 있는 이(理)를 찾으라는 주자의 격물궁리(格物窮理)의 가르침에 따라 뜰에 있는 대나무 앞에서 일주일을 밤낮으로 앉아 대나무의 이(理)를 찾으려고 할 정도였다. 이렇게 해도 대나무의 이(理)가 무엇인지는 찾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병만 얻었다.
이런 경험에서 그는 주자가 말하듯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一木一草)’를 포함하여 그 많은 사물에 들어 있는 각각의 이(理)를 다 찾는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발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산중에서 귀양살이를 하는 도중, 어느 날 밤 갑자기 깨침에 이르렀다. 『대학』의 기본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다. 이런 와중에 육상산의 ‘심즉리(心卽理)’라는 가르침에 접하게 되었다. 심(心)을 중심으로 하는 육상산의 학문이야 말로 ‘맹자의 학’을 계승하고 있다고 믿고, 57세로 죽기까지 심학을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 했다. 이런 면에서 육상산의 학문은 사실 왕양명에 의해 다시 발굴되고 새롭게 빛을 보게 된 셈이다.
心卽理는 맹자의 학 계승
왕양명의 주된 관심은 수행방법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윤리적 실천이었다. 왕양명도 육상산과 마찬가지로 심(心)이야 말로 이(理) 자체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이(理)를 알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심(心)을 궁구하면 된다고 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에 성(誠)과 경(敬)을 다할 뿐이지, 구태여 외부 사물의 이(理)를 섭렵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런 태도는 경서(經書)라든가 정치적 권위나 질서 등 외부적인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파격적 생각일 수도 있다. 어느 면에서 선불교에서 말하는 불립문자(不立文字)이라든가 교외별전(敎外別傳)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왕양명의 사상 중 가장 독창적이면서 중요한 것을 들라면 아무래도 ‘치양지(致良知’) 혹은 ‘양지(良知)’라 할 수 있다. 『대학』에 나오는 ‘격물치지(格物致知)’에서 ‘치지(致知)’를 ‘치양지’로 바꾸었다. ‘양지’란 『맹자』에서 ‘양지양능(良知良能)’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왕양명은 양지를 나름대로 ‘어리석은 남자나 어리석은 여자나 성인이나 똑 같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래적 도덕지(道德知), 직관 같은 것으로서 인간 생명력의 근원이라 풀었다. ‘천리(天理)’나 ‘성(性)’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양지는 인간이 본래부터 타고 나는 본마음임을 강조하는 셈이다. 따라서 ‘치양지’란 이런 생래적 본마음을 최대로 활성화한다는 말과 같다. 누구나 이렇게 활성화한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따르는 한 그 행동은 자연히 선하고 바르고 의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왕양명은 자기의 이런 생각을 사구교(四句敎)로 요약했다.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을 마음의 본체라하고, 선은 있고 악이 없는 것을 의지의 움직임이라고 하고,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을 양지라 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을 격물이라 한다.” 이(理) 자체인 심(心)은 선악의 구별을 초월하는 원초적 본질인데, 거기에 의(意)가 움직이면 선과 악의 구별이 생기고, 이 때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양지요, 양지에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 격물이라는 뜻이다. 주목할 것은 ‘격물’을 ‘사물을 궁구함’으로 푸는 대신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라는 실천 윤리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격물치지(格物致知)가 아니라 치양지를 통해 격물할 수 있다는 ‘치양지격물(致知格物)’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기도 하다.
‘致知’대신 ‘致良知’ 주장
여기서 중요시 되는 것은 양지를 통해 내적 깨달음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것이 왕양명이 강조하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이다. 그는 『대학』에 나오는 “좋은 색을 좋아하고 나쁜 냄새를 싫어한다”는 말을 가지고 이를 설명한다. ‘좋은 색이다’하는 지적 판단에는 이미 그것을 ‘좋아함’이라는 행동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知)와 행(行)은 서로 떨어질 수 없이 하나라는 것이다. 구태여 구별하자면 “지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성”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왕양명은 심학을 처음 시작한 정호의 ‘만물일체(萬物一體)’론을 수용해서 양지와 조화시킨한다. 정호가 말한 것처럼, 천지만물은 인간과 원래 일체라는 것이다. 왕양명은 우리가 사사로운 뜻이나 욕심만 일으키지 않으면 양지에 의해 만물과의 일체성을 깨닫고 타자와 아픔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자연히 고통을 줄이려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일이 가능할 때 인간 세상은 물론 우주가 지선체(至善體)라는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왕양명은 또 수련 방법으로 독서나 정좌(靜坐) 같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보통의 사물을 접하면서 얻어지는 경험을 통해 양지를 연마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이 이른바 사상마련(事上磨鍊)이라는 것이다.
천지와 인간은 본래 하나
한국에는 16세기에 양명학이 들어왔다. 허균(許筠)과 실학파에 속했던 몇몇 유학자들이 양명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체제 유지에 유리한 주자학에 비해 개인의 체험을 중요시하는 양명학을 위험시하여 결국 한국은 중국 일본에 비해 양명학의 영향이 더욱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불교가 현대인에게 어필하는 것을 볼 때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면을 강조한 양명학도 오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여겨진다.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 명예교수


'카톨릭 이미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회 불의 항거했던 유대교 예언자 "아모스 (0) | 2017.09.30 |
|---|---|
| 카발라의 스승들-아불라피아와 모세 드 리옹 (0) | 2017.09.30 |
| 주님의 부활 (0) | 2017.09.30 |
| 이론보다 깨달음 설파한 心學의 선지식/육상산과 왕양명 (0) | 2017.09.30 |
| 자유와 해탈 얻으려면 비우고 다만 흘러가라” -장자(莊子) (0) | 2017.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