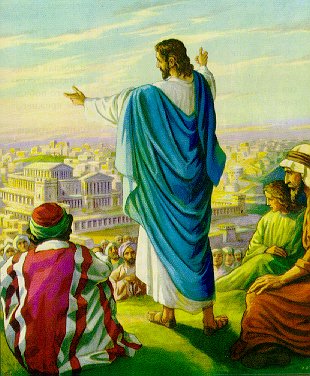
비움과 청빈으로 신과 합일 가르친 춤추는 성자
루미(Rumi 1207~1273)
“페르샤 출신 수피시인…대서사시 ‘마드나위’ 남겨
“빙글빙글 도는 소용돌이 춤 수행으로 신비경 경험 ’
“소금이 바다에 녹듯 신의 속성에 나 녹여야” 주장
루미의 무덤.
지난 회에 이슬람에서 발생한 신비주의적 전통인 수피 사상을 집대성한 가잘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회에서는 수피 전통에 속하는 유명한 시인 잘랄 알딘 루미(Jalal al-Din Rumi)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슬람이 많은 지역을 정복하면서 부를 축적하게 되자, 세속적인 부와 사치를 즐기는 삶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피 운동은 이런 외형적이고 형식적 이슬람에 대한 일종의 반응으로 생겨난 신비주의 운동이었다. 수피들은 특별한 조직이 없이 청빈과 극기의 삶을 살고, 모든 것을 신의 섭리에 맡긴 채 명상과 기도에 전념했다. 그들은 인간과 신을 분리시키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신과 하나 됨을 자기들의 종교적 목표로 삼았다. 정통 이슬람은 수피들을 위험한 이단으로 취급했지만 수피 자신들은 자기들이 이슬람의 기본 가르침에서 이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슬람은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다른 어느 종교보다 강조하는 유일신론(monotheism)의 종교로서, 이런 이슬람에서 신과 인간의 합일을 강조하는 신비주의 전통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종교든 그 심층 깊이에 들어가면 신비주의적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 형상이라는 점에서, 이것도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이슬람의 신비주의도 다른 종교의 신비주의적 심층과 여러 가지 공통적인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모든 수피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공통성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신의 초월과 동시에 내재를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범재신론(panentheism)’적 신관이라 할 수 있다. 신은 하늘 저 멀리에 홀로 떠 있는 초월적 존재만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동떨어진 개별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버릴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살고 움직이는 신의 삶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비록 인간이 현재로서는 불완전하지만 인간 안에는 거룩한 신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셋째, 인간과 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막을 걷어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받아들인다. 넷째,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서’ 신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실 이와 같은 것은 거의 모든 종교의 신비주의 전통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수피의 신비적 전통은 이와 함께 그 역사적, 사회적 특수 조건 때문에 그 나름대로 몇 가지 다른 특색을 함께 가지고 있다.
신비주의 연구가 햅폴드(F. C. Happold)에 의하면, 첫째, 수피 전통은 ‘버림’을 강조한다. 이 버림은 세상을 등지는 것과 같이 세상과 무관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 ‘나 스스로를 버리는 것(self-renunciation)’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주의적인 나를 버릴 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자기가 세상과 완전히 일체 될 때, 보편적 생명, 신, 영, 참 나와 하나가 됨을 체험하고 세상을 달리 보게 된다.
둘째, 자신을 버리고 세상과, 그리고 신과 하나 됨을 경험한 수피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경험을 시적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했다. 수피 전통에는 이처럼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통해 신의 절대적 아름다움과 절대적 사랑을 발견하고 노래한 시인들이 수없이 많았다.
셋째, 나를 세계나 신과 합일시킨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럴 경우 자칫 지금의 헛된 나를 신과 동일시하고 지금의 나를 올려 세우는 위험이 따른다. 개별적인 이기적 자아 자체를 신격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신비주의 전통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위험이지만, 수피 전통에서는 가잘리 같은 학자가 등장해서 이런 위험을 계속 경고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초기 수피들 중 가장 잘 알려진 이는 최근 이라크 전쟁으로 유명해진 도시 바즈라 출신의 성녀 라비아(Rabi'a, 801사망)였다. 그녀는 이른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랑’(disinterested love)을 노래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시들 중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시가 있다.
“오, 주님, 제가 주님을 섬김이 지옥의 두려움 때문이라면 저를 지옥에서 불살라 주옵시고, 낙원의 소망 때문이라면 저를 낙원에서 쫓아내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주님만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제 이런 배경 지식과 관점에서 페르시아의 수피 시인 루미<사진>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자. 루미는 1207년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중앙 지대 북쪽 가장 자리에 있는 발흐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에는 훌륭한 수피 신학자이자 법률가였던 아버지와 함께 바그다드, 메카 등지를 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받았고, 청년 시절에는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예언자들과 성자들의 학문’을 배웠다.
루미는 위대한 종교학 교수로서의 삶을 살다가, 37세에 샴스라는 어느 나이 많은 야인(野人)을 만나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고 그와 함께 황홀경에 거닐며 신과의 사랑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노래하는 시를 쏟아냈다. 루미는 특히 소용돌이처럼 빙글빙글 도는 춤(whirling dance)을 추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를 권했다. 이 춤을 통해 신과의 합일이라는 신비경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때문에 그와 그의 수도사들을 춤추는 수도사(dancing dervish)라 하기도 한다.
루미는 두 권의 시집과 한 권의 산문집을 남겼다. 시집 중 하나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합친 것보다도 더 방대한 분량의 대서사시 『마드나위』라는 것이다. 이 책은 이슬람 신비주의 사상과 시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역작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으로 꼽힌다. 이슬람 문학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은 영역 본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한국어로는 이현주 목사가 그 중 144편을 가려 뽑고 해설을 붙여 『사랑 안에서 길을 잃어라』(샨티, 2005)라는 제목의 책으로 엮어냈다. 티모시 프리케가 엮고 이현주 목사가 옮긴 『루미의 지혜』(드림, 2007)도 참고할 수 있다.
루미는 1973년 12월 66세로 터키의 코냐에서 ‘신과 완전한 합일’을 이루고 죽음을 맞이했다. 루미는 다른 수피 신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곧 신(人乃天)”이라고 하는 진리를 강조했다. 이런 신인합일의 체험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점진적인 수행과정이나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과의 합일에서는 오는 ‘기쁨’에 이르기 전에 신으로부터 떨어져 있음에서 오는 ‘아픔’을 경험하라고 가르친다. 인간은 물론 본질적으로 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신과 분리된 삶을 사는 인간이라는 역설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일종의 참회와 고백인 셈이다.
“그대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 죄를 하느님 앞에 겸허히 고백하여 그의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그대의 마음을 바꾸어 그대가 행한 것들을 미워하고 완전히 버리도록 하라.”
신과의 합일에 이르는 과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과 떨어져 있는 개별적 존재로서의 나를 ‘이슬람’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신에게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버림, 청빈, 신에 대한 신뢰 등이 뒤 따른다. 이런 수행의 근본 목적은 자기의 뜻을 없애고 신의 사랑에 녹아나는 것이다. “소금이 바다에서 녹듯, 나도 과거의 믿음, 과거의 불신, 과거의 의심, 과거의 확신과 함께 신의 바다에 삼킴을 당했다”(Happold, 256)고 할 정도로 나를 신과 그의 사랑에 몰입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수행을 거쳐 결국 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면 그 사랑 안에서 더 이상 ‘그대’와 ‘나’라는 이분법적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아가 사랑의 대상에서 녹아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무아(無我)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참된 ‘깨침’을 얻고, 진실로 자기와 신이 하나라는 것, 그리하여 자기가 곧 신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나는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신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라 주장했다. 내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방기하고 스스로를 완전히 비웠지만, 나는 신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신과 떨어져 별개로 존재하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내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신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다시 한 번 수피 전통을 아우르는 세 가지 기본 개념을 소개 한다. 첫째는 ‘tawhid(일치)’라는 개념이다. 인간이 신의 속성을 취해서 그것들을 자신의 속성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루미에 의하면 “인간의 속성은 신의 속성에서 소멸되고 만다. 나의 에고는 없어지고 신만이 남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이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인간을 통해 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셈이다. 가히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道)의 작용이라 보는 노장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연상시키는 생각이다.
둘째, ‘fana(없어짐)’이다. 지난 회에 소개한 가잘리가 이를 가장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경배하는 사람이 더 이상 자기의 경배나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가 경배하는 분에 몰입되고 마는데, 이런 상태를 ‘파나’라고 한다. 이 때 사람은 자기로부터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신체 부분이나, 외부에서 지나가는 것이나, 자기 마음에서 지나가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셋째, ‘baqa(신 안에 거함)’이다. 파나로 자기가 없어졌다고 하여 나의 존재 자체가 흔적도 없이 무의미하게 소멸된다는 뜻이 아니다. 나와 신이 분리되었다는 그릇된 생각이 없어질 뿐, 사실은 내가 신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 속에 거한다고 본다.
루미는 인간이 다음과 같이 읊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신의 속성에 동참하는 것....
신과 영원히 연합된 영은 모든 장애로부터 자유케 되리.”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 명예교수


'카톨릭 이미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자사상을 체계적으로 공격한 최초의 인물/묵자 (0) | 2017.09.30 |
|---|---|
| 부활의 의미 1 (0) | 2017.09.30 |
| 달라진 꿈의 세계 -송현마스타 신부님- (0) | 2017.09.30 |
| 인욕·윤리적 삶 강조한 청빈한 스토아철학자 / 에픽테투스 (0) | 2017.09.30 |
| 평화의 기초이며 평화로 향한 길인 형제애(fraternity (0) | 2017.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