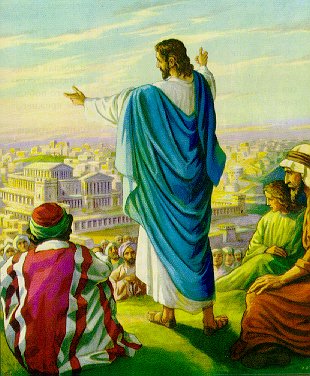
新플라톤주의 창시자…서양 신비주의의 원류 플루티누스
라파엘이 그린 플로티누스 초상화.
6부작 ‘엔네아드 9편’에 사상 담겨
플로티누스는 일반적으로 플라톤 사상의 계승자로서 이른바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라 불린다. 사실 플라톤의 사상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스토아학파의 사상에도 영향을 받고 이런 사상들을 자기의 종교적 사상으로 종합하려고 노력했다. 플로티누스는 이집트 북쪽에서 그리스인(희랍인)이라기보다 그리스화한 이집트 사람으로 태어났으리라 본다. 따라서 그의 이름을 그리스어 어법에 맞게 플로티노스(Plotinos)라 할 수도 있지만, 나중 로마에 가서 가르쳤기 때문에 라틴어 어법에 맞게 플로티누스(Plotinus)라 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편의상 후자의 이름을 사용하기로 한다.
플로티누스는 젊은 시절 그 당시 학문의 중심지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살다가 28세에 철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플라톤 철학을 가르치던 암모니우스 사카스의 제자가 되어 11년간 플라톤 사상에 몰두했다. 그 당시 유명한 그리스도교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리고 오리게네스와 함께 공부했다. 플로티누스는 스승으로부터 배운 페르시아와 인도의 지혜에 대해 직접 알아보기 위해 로마황제 고르디아누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원정군에 합류하기도 했다. 황제가 살해되자 그는 패잔병 신세로 안티옥을 거쳐 로마로 갔다. 거기에서 철학 학교를 설립하여 제자들을 가르치고, 10여년 후부터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중 그의 제자 포르피리오스(Porphyryos)가 이 글들을 모아 6부작의 책으로 펴냈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엔네아드(Enneads, ‘9편’)』이다. 6부작의 각 부가 ‘9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런 이름이 붙었다.
서양 신비주의 전통에서 플로티누스의 위치는 괄목할 만하다. 그는 그리스도교 사상을 건설한 제4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와 제6세기 위(僞) 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에 크게 영향을 주어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인물 중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자들에게 플로티누스 만큼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세기 이르러 고전 그리스 사상이 부흥하면서 그의 생각은 개신교 신비주의자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주었고, 나아가 이슬람의 수피 신비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므로, 플로티누스는 가히 서양 신비주의 사상의 원조라 불리어도 손색이 없다.
플로티누스의 사상의 근간은 이른바 유출론(流出論, emanation theory)이다. 그는 모든 것의 통합체로서의 절대적 실재가 있고, 그 속에 서로 독특하면서도 분리되지 않은 세 가지 신적 실재들(Hypostases)이 있다고 보았다. 이 세 가지를 그리스어로 각각 헨(to Hen), 누우스(Nous), 프쉬케(Psyche)라 한다. 똑같지는 않지만 절대적 신(Godhead)을 성부·성자·성령이라는 세 가지 위(位, persona)로 보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론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기독교·이슬람 신비주의에 영향
절대, 최고, 근원으로서의 궁극 실재 내에서 제1의 위치에 해당하는 ‘헨’을 영어로는 ‘the one’이라 옮기고, 한국에서는 보통 일자(一者)라 하는데, 순수 우리말로 옮기면 물론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일자’는 모든 존재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있다’ ‘없다’ 혹은 ‘크다’ ‘작다’고 하는 등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일체의 범주나 개념, 생각이나 이론 등에서 벗어난 무엇이다. 마치 일체의 분별지를 거부하는 불교의 공(空)을 연상케 한다. 한국의 유영모 선생님이 인격화해서 한 말처럼 ‘없이 계신’ 분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이 일자는 오로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실재로서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흘러나오는 시원이나 근원이기도 하고 또 모든 존재들이 결국에는 다시 되돌아가야 할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지고선의 본원’이며 ‘가장 위대한 것을 넘어서는 위대함’이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렇게 모든 존재의 초월적 근원이라고 하여 모든 존재 밖에 따로 독립되거나 분리된 실재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일자는 만물을 초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물 중에 내재하기도 한다. 일중다(一中多) 다중일(多中一), 혹은 상즉(相卽)·상입(相入)의 관계와 비슷한 셈이다. 절대자를 이런 식으로 초월이냐 내재냐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초월이면서 동시에 내재라고 하여, 초월도 되고 내재도 된다고 보는 것을 ‘범재신론(panentheism)’이라 한다. 옥스퍼드 대학교 존 맥퀘리 같은 이는 이런 실재관이 범신론(pantheism)과 유신론(theim) 모두를 거부하며 동시에 아우르는 것이라는 뜻에서 이를 ‘변증법적 신관(dialectical theism)’이라 하기도 한다.
아무튼 이 제일의 실재인 일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제2의 실재인 ‘누우스(Nous)’이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Idea)’의 세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영어로는 보통 ‘Intelligence’, ‘Mind’, ‘Spirit’ 혹은 ‘Intellectual Principle’이라 번역한다. 한국말로는 보통 ‘정신’이라 하는데, 불교에서 쓰는 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심’ 혹은 ‘한마음’이라 해서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다.
유일신 넘어 변증법적 신관 주장
물론 이렇게 ‘흘러나왔다’고 하여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일자가 독자적으로 어디에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생겨났다는 뜻이 아니다. 마치 불과 열, 태양과 빛, 향수와 향기의 관계처럼 둘은 하나도 아니지만 또 완전히 둘도 아닌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신유학에서 이(理)와 기(氣)를 두고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 선후(先後)를 따질 수 없다고 하는 주장과 비슷하다고 할까.
누우스는 ‘존재의 계열(the hierarchy of being)’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존재 영역에서는 최고의 실재라 할 수 있다. 일자 혹은 하나라고 하는 비존재의 영역에서 다양한 존재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경계선에 있는 실재, 그래서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해 생겨나게 하는 무엇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한 편으로는 절대적인 하나와 동등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만물과 닿아 있는 존재의 영역에 속한다. 이(理)이면서 동시에 사(事)이기도 하여 이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사무애(理事無)의 경지라 할까. 그리스도교 성서 『요한복음』1장 서두에 “태초에 ‘로고스(Logos)’가 있었다.... 모든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것이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할 때 그 로고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중다(一中多)·다중일 주장
다시 누우스로부터 흘러나오는 제3의 실재를 프시케(Psyche)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Soul’, 한국어로는 ‘영혼’이라 번역한다. 누우스와 현상세계의 중간에 위치한다. 이 영혼에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영혼과 개인적인 영혼이 있다. 보편적인 영혼은 모든 것에 분산되어 사람을 비롯하여 동식물 등 물질세계의 모양을 형성하고 그 활동을 관장한다. 플로티누스에 의하면, 이 물질세계, 혹은 현상세계는 영혼이 신령한 것 중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지고 만든 세계이기에, 그 당시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던 것과는 반대로,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개인적인 영혼은 우주적 영혼의 개별화나 분화인 셈이다. 개인적 영혼에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최하의 형태는 동물적이고 감각적인 것으로 우리의 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중간 형태의 영혼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특히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지어주는 것이며, 셋째 가장 높은 형태의 영혼은 자기의 개체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누우스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초인간적 형태의 영혼이다. 이런 최고 형태의 초개인적 영혼은 우주적 한마음과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르다. 플로티누스 자신의 말을 빌리면 “이 둘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둘이다.”
플로티누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출(流出)을 반대 반향으로 역류(逆流)시키는 것이다. 인간 속에 있는 최하질의 영혼에 얽매이지 말고, 제2의 이성적 영혼을 정화하여 최고 형태의 영혼이 우리를 관장하도록 함으로 영혼이 다시 누우스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더 나아가 일자 혹은 하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다시 최초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이다. 나의 근원 나의 참 나를 찾는 것이다.
영혼을 정화하면 근원으로 회귀
제2의 영혼이 정화하는 방법으로 예술(음악)과 사랑과 깨침을 강조한다. 음악이나 사랑을 통해 영혼이 일자와 하나로 녹아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길은 깨침 혹은 철학의 길을 통해 ‘네 자신을 알라’는 말에 따라 나의 근원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 이 방법을 통해 영혼이 다양성의 세계에서 사사무애의 합일의 세계로 승화될 때 자의식(自意識)은 사라지고 신적 의식에 몰입되는 황홀경(ecstasy)을 경험하게 된다. 플로티누스 자신은 철학 혹은 깨침의 길을 통해 일생에 네 번 이런 경지를 맛보았다고 한다.
플로티누스의 유출론과 똑 같지는 않지만,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재미있다. 제42장에 보면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습니다.”하는 말이 있다. 절대무, 절대적인 비존재로서의 도에서 모든 존재의 시초요 근원인 ‘하나’가 나오고, 여기에서 점점 많은 것이 나타나는 우주창생론(cosmogony)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더구나 『도덕경』의 중심 사상 중 하나가 만물이 도로 다시 ‘돌아감’이라 보는 것도 신기한 일이다. 32장에 “세상이 도(道)로 돌아감은 마치 개천과 계곡의 물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듦과 같습니다.”고 하고, 또 40장에는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입니다.”고 했다.
학자들 “화엄과 관련 있을 것” 주장
플로티누스가 인도사상, 특히 불교사상, 그 중에서도 특히 화엄(華嚴)과 관련 있으리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동경대학에서 불교를 가르치던 나카무라 하지메(中村 元) 교수를 비롯하여 몇몇 학자들의 주장이다. 역사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든지 없든지 양쪽 사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작업도 흥미 있고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물론 『대승기신론』 같은 문헌과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비교 연구를 통해 동서양 신비사상의 원류, 혹은 접촉점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 명예교수


'카톨릭 이미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평화의 기초이며 평화로 향한 길인 형제애(fraternity) (0) | 2017.09.30 |
|---|---|
| 성전에서 찾은 예수 (0) | 2017.09.30 |
| 바오로 대성당 유럽(남유럽,이탈리아,로마 (0) | 2017.09.29 |
| 베드로 성당 (남 유럽,이탈리아,로마) (0) | 2017.09.28 |
| 해미 카톨릭 순교성지 (0) | 2017.09.28 |